⊙ 1964년 여성잡지 《女像》 8월호에 시
<한강변> 실어
⊙ 사후 44년이 지나도 날카롭고 비판적인 작가정신 읽을 수 있어
⊙ 사후 44년이 지나도 날카롭고 비판적인 작가정신 읽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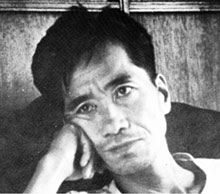 |
《월간조선》 8월호와 9월호에 걸쳐 공개하는 작품들은 모두 《김수영 전집》(민음사刊)에서 빠진 것으로 시와 산문, 번역문, 시월평을 망라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서슴없고 가장 치열한 양심의 극(劇)”(유종호)이란 표현처럼, 날카롭고 비판적인 작가정신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시인이 타계한 지 44년이 지났으나 지금의 시각에서 읽어도 손색이 없다.
먼저, 시 <한강변>은 1965년 8월호 여성잡지 《여상(女像)》에 게재됐다. 모래섬에 불과하던 여의도에 개발바람이 일던 1960대 중반의 어수선한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땅을 돋우기 위해 인근 밤섬을 폭파하기 직전의 이야기다. 시인은 ‘아직도 밤섬에서는/땅콩들을 모래 위에 심고/나룻배를 타고 건너오는…’이라며 추억에 잠긴다. 그러나 그 어조는 무척 쓸쓸하다.
또 1949년 4월 1일자 《자유신문(自由新聞)》에 게재됐던 시 <아침의 유혹(誘惑)>의 시어(詩語)를 일부 복원해 《월간조선》에 다시 싣는다. 그동안 마이크로필름 보관상태가 나빠 의미전달이 불가능했던 오탈자(誤脫字)를 바로잡은 것이다.
直線의 산문가
 |
| 김수명 선생과 김수영(오른쪽). |
1960년 4·19와 4·26(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 발표일) 이후인 5월 20일자 《경향신문》 4면에 실린 〈책형대에 걸린 시(詩)>는 김수영의 날카로운 산문정신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책형대(刑臺)란 죄인을 기둥에 묶어 세워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행하던 틀을 말한다. 시인은 ‘… 시대의 윤리 명령은 시(詩)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센 혁명의 마멸 속에서 나는 나의 시를 다시 한번 책형대 위에 걸어 놓았다’고 선언한다. 시대에 편승하거나 권력에 기대는 작가들을 ‘아부시인’, ‘어용시인’으로 규정하며 시인 휘트먼의 말을 빌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시인이 되기 전에 이 나라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썼다.
성인취향의 잡지 《신태양》의 1954년 8월호에 실린 <해운대에 핀 해바라기>는 에피소드 형식의 콩트, 혹은 단편소설 같은 이야기다. 실화인지 가공의 얘기인지 헷갈린다. 작품을 발표한 1954년은 김수영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부산·대구 등지에서 통역관, 선린상고에서 영어교사를 하던 시절이다. 실제로 이 작품 속의 ‘나’는 학교 선생이다.
누이 김수명이 오빠의 작품을 널리 알려
 |
| 김수영시비 앞에 선 김수명 선생. |
한국문단에서는 ‘동생 김수명이 없다면 김수영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누이는 오빠의 시가 세상의 조명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빠가 생전에 선별해 준비해 두었던 작품들을 한 자, 한 획 다치지 않고 살려서 1981년 출간한 전집에 묶을 수 있었지요. 또 1981년판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누락·발굴 작품도 보완해 2003년 한글판으로 새 전집을 펴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전집을 준비 중인데 새로운 작품을 찾게 됐으니 기뻐요.”
그는 “시인 김수영이 한국시단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크다”며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 시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오빠는 언어를 통해 자유를 읊었고, 또 자유를 살았다”고 회고했다.
시인의 작품에 대한 독자나 평론가의 오독(誤讀)은 없었을까. 김수명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엔 좁은 소견으로 많이 속 끓이기도 하고, 안타까워한 적도 있어요. ‘왜 그 깊은 뜻을 알려 하지 않고 껍질만 보나’고요. 이젠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작품을 세상에 내놓은 이상, 모든 것은 독자의 몫이요 평론가의 몫이라고요.”
김수영과 도봉산
 |
| 김수영 조카 김민. |
“이후 오빠 묘도 그곳(도봉산)에 썼다가 1994년 폐묘하게 되어 조상 유해와 함께 화장을 해 모셨습니다. 1998년 우리 가족은 그곳을 떠났지요. 제가 그곳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살았으니 오빠 생전에도, 사후에도 함께한 공간이랄 수 있겠죠.”
현재 도봉구 방학3동 문화센터 건물 1~2층에 시인의 자료관이 조성되고 있다. 시인의 육필원고, 저서, 김수영론과 관련한 자료, 시인의 작품이 포함된 서적, 시인의 애장도서와 애장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인 김민은 김수영의 조카다. 2001년 문학계간지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 2007년 처녀 시집 《길에서 만난 나무늘보》를 펴냈다. 김민씨는 “제가 태어나기 넉 달 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도봉산 선영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인지 ‘김수영시비’에 자주 올라가곤 했다”고 말했다.
“큰아버지 시 중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달나라의 장난>입니다. 이 시처럼 꾸밈이 없고 솔직하면서도 가슴이 찡해져 오는 것, 이 점이 김수영 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글 : 金泰完 月刊朝鮮 기자
글 : 金泰完 月刊朝鮮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