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때 들은 <赤旗歌(적기가)>
결혼잔치는 破興(파흥)이 되고―
張良守
조갑제 닷컴
나는 60을 넘은 나이에 영국 여행을 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타워브리지, 런던탑을 보아도 그저 무덤덤하기만 했다. 그런 나의 시큰둥한 마음은 대영박물관에 들러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로제타스톤 앞에 섰을 때도 ‘이거였구나, 그들이 남의 나라에서 강탈해 온 그 보물이…’ 싶었고, 클레오파트라 미라 앞에서는 세계사에 질펀한 화제를 뿌린 그 여왕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肉塊(육괴)로 저렇게 만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구나 싶었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역시 여행도 감성이 팔팔한 젊을 때 하는 것이지, 볼 것 못 볼 것 다 본 노년에는 구경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大英圖書館(대영도서관)에 들어선 나는 한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버렸다. 안내인은 그 도서관의 1층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가 딸린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가리키며 저것이 마르크스가 매일 와서 앉아 《자본론》을 구상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그 惡(악)의 씨앗이 싹튼 곳이란 말인가? 그 사상은 지난 세기 70 여 년 동안 인류를 얼마나 끔찍스런 지옥으로 몰아넣었던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악마의 목소리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다. 국토는 분단되고 수많은 혈육이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그들의 침략으로 나라는 초토가 되고, 수백 만 명의 동포가 죽고 다치고…. 또 지금도 몇 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린 나를 안아 키우고, 업어 키워 준 내 둘째 누나의, 그로 인한 가련한 삶이 자꾸 눈에 밟혀 더욱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누나의 불행은 해방 2년 뒤 내 나이 일곱 살 때, 누나가 결혼을 하던 그 날에 벌써 예고가 되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는 신랑 신부와 집안 젊은이들이 떠들썩한 잔치판을 벌였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싸늘해져 버렸다. 술상을 둘러앉아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신랑이, 자기 차례가 되자 <赤旗歌(적기가)>를 부른 것이다.
그때 나는 어려서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는데,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하는 구절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내가 살던 고향에서는 좌익분자들이 날뛰어 분위기가 여간 살벌하지 않았었다. 바로 그 얼마 전에는 우리와 이웃해 있는 면의 면장이 그들에게 살해되었고, 우리 면에서도 그들의 방화로 면사무소가 전소(全燒)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빨갱이’라 하면 누구나 쉬쉬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장가 온 신랑이 그런 노래를 불렀으니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이 술자리에 앉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젊은 사람들끼리 놀라고, 자리를 피해 사랑에 가 계시던 아버지였다. 당시 47세로 아직 젊으셨던 아버지는 그 노래의 가사, <민중의 저 붉은 기로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헐조(血槽)는 깃발을 물들인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신부의 아버지로서, 가장 축복 받아야 할 결혼잔치 자리에서 신랑이라는 사람이 ‘붉은 기’가 어쩌니 ‘시체’가 어쩌니 했으니 얼마나 불길했을 것이며, 열아홉 살 어린 딸의 장래가 얼마나 걱정스러웠겠는가.
아버지는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떠나기에 앞서 그를 좋은 말로 타이르신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럴 때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나서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나서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다 한다. 그러자 그는 대뜸 ‘그럼 나라 일은 누가 봅니까?’ 라고 했던 모양이다. 뒤에 생각하니 그는 그때 이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도 제 나름으로는 알아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나오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않으셨다 한다. 다만 그 뒤에 ‘흥, 나라 일, 나라 일…’ 하는 말씀만 몇 번을 하셨다 한다.
아버지의 걱정대로 그는 6·25사변이 일어난 며칠 뒤 집을 나가 이날까지 소식이 없다. 아마 곧 어디선가 죽었을 것이다. 小學校(소학교)도 못 나온 스물 몇 살 시골 청년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면 얼마나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그도 마르크스라는 惡鬼(악귀)의 魔手(마수)에 걸려든 희생자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거야 그의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지만, 그 바람에 내 누나는 그가 남겨 두고 간 세 살, 한 살 된 핏덩이 같은 어린 것들을 데리고 70평생을 고생, 고생하며 살다 세상을 떠났다. 부모 마음 아플까봐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이것이 내 팔자거니, 이것이 사는 것이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곁에서 보기에 누나의 생은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날의, 여행 일정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惡業(악업)을 하늘에 닿게 쌓은 그 적갈색의 저주 받은 책상이 눈에 어른거려 한밤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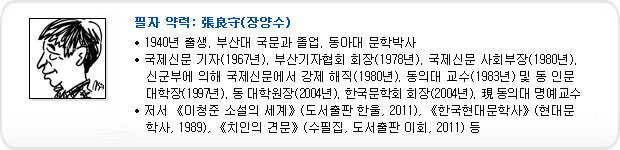 | |
'6.25 動亂史' 카테고리의 다른 글
| Why is Korea the "Forgotten War"? (0) | 2015.10.15 |
|---|---|
| 부산 국제시장서 만난 진짜 '덕수'들 (0) | 2015.10.05 |
| Re-Enacting the Korean War (0) | 2015.10.02 |
| 6.26 동란 이전의 주요 사건 사진 (0) | 2015.09.30 |
| 미군이 촬영한 6.25 사진 모음 (0)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