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6.09 03:00
[김동길 인물 에세이 100년의 사람들] <29> 선우휘(1922~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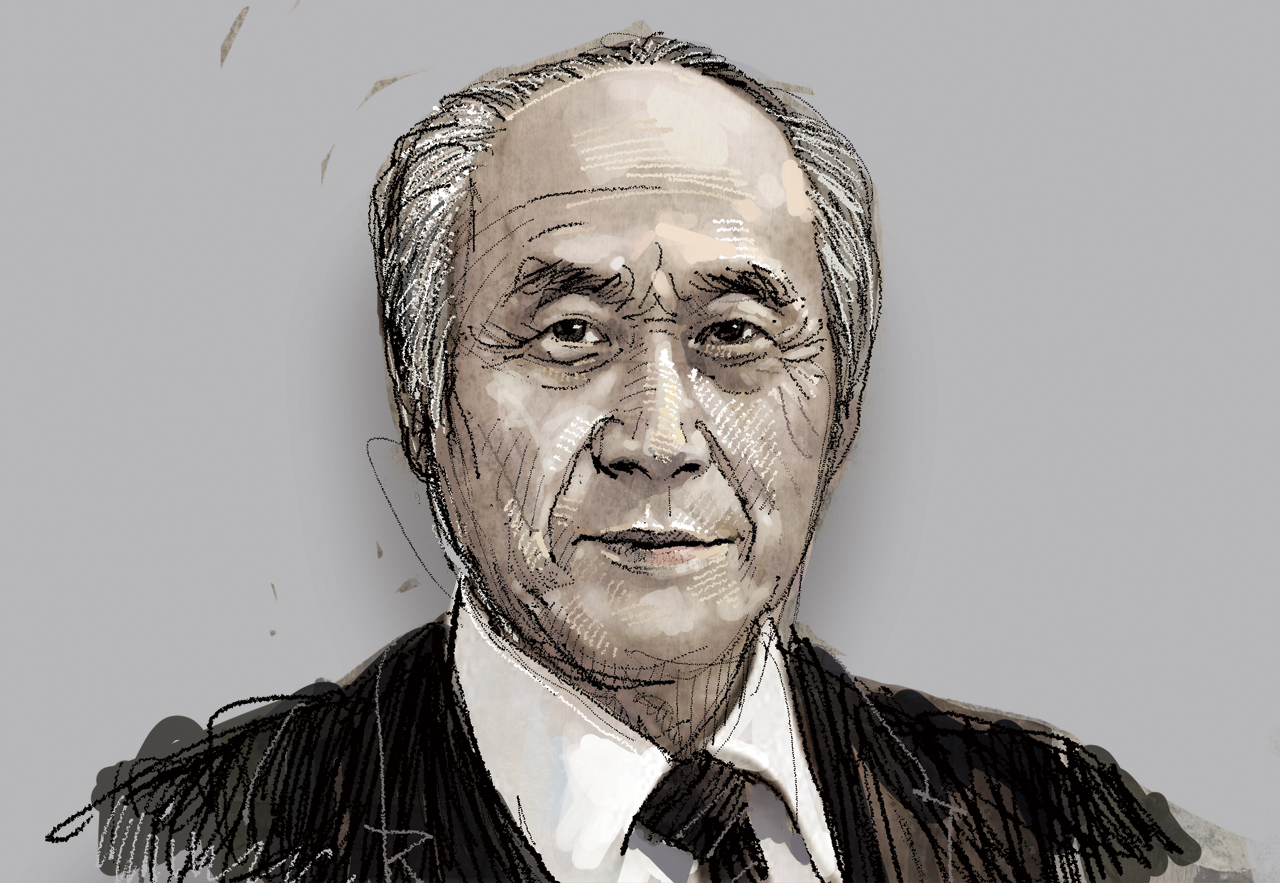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1972년 9월 남북 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 대표 연설을 나의 누이인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에게 부탁한다는 청와대의 통보가 있었다. 연설을 앞두고 우리 남매가 상의한 끝에 선우휘와 양호민을 초청하여 우리 집에서 저녁을 같이하고 장시간 의견을 나눈 끝에 그 연설문이 작성되었다. 글의 끝을 손질한 것은 나였지만, 의견 대부분은 선우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북에서 온 대표들도 감탄하였다는 그 연설은 명연설이었다.
선우휘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 시골에서 태어나 당시에 경성사범에 입학한다는 것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일제하에서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학교에 지망하였다. 선우휘는 사범학교를 마치고 국민학교 교사 노릇을 한동안 했지만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골에서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을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1946년에 월남하여 고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사장 계초 방응모를 찾아가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고 방응모는 선우휘를 사회부 기자로 채용하였다.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훈장교로 자진 입대하였다. 1949년 4월에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승진이 빨라 두 달 만에 중위가 되고 6·25가 터지던 1950년에는 육군 대위로 진급, 국방부 정훈국의 보직을 받았다. 선우휘를 우익이니 반공이니 하여 헐뜯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평하는 자들은 선우휘의 사람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는 북에서 김일성이 하는 짓을 똑똑히 보고 38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잘못된 이념이요 잘못된 사상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선우휘는 40년대 이미 그런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를 자유민주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를 맹목적 반공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6·25 때 일선 군단의 유격대장으로 자진하여 참전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훈장교로 활약하다가 1955년 대령으로 진급, 예편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소설을 탐독하였고 '신세계'라는 잡지에 '불꽃'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이르렀다. 제2회 동인문학상이 선우휘에게 수여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고민하고 고민하다 광복과 6·25를 맞이한 한 청년 지성인의 삶을 조명하였는데,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잘못된 이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였으니 그를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선우휘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입사한 것은 1961년 5월 일이었다. 그는 출근길에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고 육군본부로 달려가서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져 보름쯤 숨어 다녀야만 했고 그 후 1년 정도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조선일보에 논설을 썼다. 박정희의 배려로 체포는 모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후 1986년 정년 퇴임 하기까지 장장 25년 편집국장, 주필, 논설고문 등으로 종횡무진 붓을 휘둘러 이름을 날렸다. 요새는 신문기자도 대개 속세의 생활인이 되어,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월급봉투를 또박또박 안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다달이 저축하여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꿈꾸고 있다지만 선우휘 시대의 언론인, 특별히 부장, 국장, 논설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봉투를 그대로 가져다 안주인에게 바치는 경우가 없었다. 대개 가불에 가불을 거듭하여 월급날이면 텅텅 빈 월급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기자들에게 저녁 먹이고 술 사주는 것이 신문사에서 한자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나 다름없던 것이다. 선우휘는 거의 매일 밤술을 마셔야 했다. 그에게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이 현재 신문사 기자이고 그 아버지를 똑 닮아서 글을 잘 쓰는 것은 고맙지만, 그 아버지와 꼭 같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 나는 가끔 걱정하는 때가 있다.
나는 선우휘의 건강이 술 때문에 점점 나빠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여름 캐나다로 강연을 갔다가 좋은 웅담을 하나 구해서 귀국 즉시로 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 웅담이 선우휘의 건강을 되찾아준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남미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강연하던 때로 기억되는데, 그가 방송 일 때문에 부산에 가 있다가 어느 허술한 여관에서 졸지에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를 보고 "김 선생, 내가 지금 작품 하나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작품을 꼭 써야만 하겠어"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던 선우휘의 그 작품은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행동하는 지성인, 이 시대의 의인, 남겨 놓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딸 셋과 아들 하나. 청렴결백하던 그는 붓 한 자루를 들고 논설도 쓰고 소설도 써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한 시대를 살다 홀연히 떠나버렸다. 어디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는 고대한다.
선우휘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 시골에서 태어나 당시에 경성사범에 입학한다는 것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일제하에서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학교에 지망하였다. 선우휘는 사범학교를 마치고 국민학교 교사 노릇을 한동안 했지만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골에서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을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1946년에 월남하여 고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사장 계초 방응모를 찾아가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고 방응모는 선우휘를 사회부 기자로 채용하였다.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훈장교로 자진 입대하였다. 1949년 4월에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승진이 빨라 두 달 만에 중위가 되고 6·25가 터지던 1950년에는 육군 대위로 진급, 국방부 정훈국의 보직을 받았다. 선우휘를 우익이니 반공이니 하여 헐뜯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평하는 자들은 선우휘의 사람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는 북에서 김일성이 하는 짓을 똑똑히 보고 38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잘못된 이념이요 잘못된 사상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선우휘는 40년대 이미 그런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를 자유민주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를 맹목적 반공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6·25 때 일선 군단의 유격대장으로 자진하여 참전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훈장교로 활약하다가 1955년 대령으로 진급, 예편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소설을 탐독하였고 '신세계'라는 잡지에 '불꽃'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이르렀다. 제2회 동인문학상이 선우휘에게 수여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고민하고 고민하다 광복과 6·25를 맞이한 한 청년 지성인의 삶을 조명하였는데,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잘못된 이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였으니 그를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선우휘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입사한 것은 1961년 5월 일이었다. 그는 출근길에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고 육군본부로 달려가서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져 보름쯤 숨어 다녀야만 했고 그 후 1년 정도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조선일보에 논설을 썼다. 박정희의 배려로 체포는 모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후 1986년 정년 퇴임 하기까지 장장 25년 편집국장, 주필, 논설고문 등으로 종횡무진 붓을 휘둘러 이름을 날렸다. 요새는 신문기자도 대개 속세의 생활인이 되어,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월급봉투를 또박또박 안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다달이 저축하여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꿈꾸고 있다지만 선우휘 시대의 언론인, 특별히 부장, 국장, 논설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봉투를 그대로 가져다 안주인에게 바치는 경우가 없었다. 대개 가불에 가불을 거듭하여 월급날이면 텅텅 빈 월급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기자들에게 저녁 먹이고 술 사주는 것이 신문사에서 한자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나 다름없던 것이다. 선우휘는 거의 매일 밤술을 마셔야 했다. 그에게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이 현재 신문사 기자이고 그 아버지를 똑 닮아서 글을 잘 쓰는 것은 고맙지만, 그 아버지와 꼭 같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 나는 가끔 걱정하는 때가 있다.
나는 선우휘의 건강이 술 때문에 점점 나빠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여름 캐나다로 강연을 갔다가 좋은 웅담을 하나 구해서 귀국 즉시로 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 웅담이 선우휘의 건강을 되찾아준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남미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강연하던 때로 기억되는데, 그가 방송 일 때문에 부산에 가 있다가 어느 허술한 여관에서 졸지에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를 보고 "김 선생, 내가 지금 작품 하나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작품을 꼭 써야만 하겠어"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던 선우휘의 그 작품은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행동하는 지성인, 이 시대의 의인, 남겨 놓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딸 셋과 아들 하나. 청렴결백하던 그는 붓 한 자루를 들고 논설도 쓰고 소설도 써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한 시대를 살다 홀연히 떠나버렸다. 어디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는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