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식 칼럼]6·25 역사를 허무는 손
기사입력 2014-06-26 03:00:00 기사수정 2014-06-27 17:10:55
기성세대 모르는 사이 확 달라진 교과서
북한의 전쟁 책임 흐리고 남한에 덧씌우기도
커밍스류의 낡은 틀에 갇힌 전복 시도 방치 안 된다
북한의 전쟁 책임 흐리고 남한에 덧씌우기도
커밍스류의 낡은 틀에 갇힌 전복 시도 방치 안 된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홍찬식
수석논설위원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6·25전쟁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기성세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탱크를 앞세워 전면적으로 남침(남한 침략)을 하면서 6·25가
일어났다고 배웠다. 이어 유엔군이 참전해 북한의 공격을 저지한 뒤 압록강까지 올라가 통일을 눈앞에 뒀으나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팽팽히 맞서다가
휴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명칭이나 용어부터 차이가 난다.
북한 공산군은 ‘북한군’으로 바뀌어 있고, 북한이 부르는 용어인 ‘인민군’이라고 쓴 교과서도 있다. 중공군은 어느새 ‘중국군’으로 대치됐고 기성세대들의 뇌리에 선명한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 ‘중국군의 참전’이라고 표현하거나 ‘중국이 군대를 보냈다’고 쓰기도 한다. 6·25가 발발하기 이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다. 교과서들은 6·25 발발 이전부터 38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6·25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달라진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은 대학교수들이 주도한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6·25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는 교과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
전쟁 책임의 ‘물타기’가 대표적이다. 6·25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치밀한 준비 끝에 감행한 것이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소련 측의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전모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엉뚱하게도 누가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흐리는 쪽으로 가버렸다.
교과서들이 ‘전부터 남북한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 강조한 이유는 남북한이 서로 다투던 와중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남침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작은 싸움’이 빈번하다 보니 ‘큰 전쟁’으로 번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 교과서는 ‘전쟁이 산하를 찢어 놓다’라며 몹시 비통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6·25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교과서만 보면 알기 어렵다. 민간인 피해의 경우 별도의 항목까지 만들어 남한의 책임을 묻고 있어 잘못이 오히려 남한 쪽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중공군 개입’을 ‘중국군 참전’이라고 바꾼 것은 기막힌 왜곡이다.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한반도 전체를 거의 장악해 통일을 기대하던 시점에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한국으로선 통탄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교과서가 ‘중국군 참전’이라거나 ‘중국이 군대를 보냈다’고 기술한 것은 이 문제를 정확히 가르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2000년대 사용됐던 한 교과서는 미국의 6·25 참전은 ‘개입’으로, 중국의 개입은 ‘참전’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교과서 내용으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국내 지식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내걸었던 관점 그대로다. 그는 “남북한의 내전(內戰) 상태에서 6·25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공산권 자료 공개로 그의 이론은 빛을 잃었다. 이른바 내전론은 ‘부분적 충돌’이라는 ‘나무’만 보고 ‘북한 소련 중국이 기획한 전쟁’이라는 ‘숲’은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과서는 30년 전 그가 만들어 놓은 낡은 틀에 아직도 갇혀 있다.
북한 공산군은 ‘북한군’으로 바뀌어 있고, 북한이 부르는 용어인 ‘인민군’이라고 쓴 교과서도 있다. 중공군은 어느새 ‘중국군’으로 대치됐고 기성세대들의 뇌리에 선명한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 ‘중국군의 참전’이라고 표현하거나 ‘중국이 군대를 보냈다’고 쓰기도 한다. 6·25가 발발하기 이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다. 교과서들은 6·25 발발 이전부터 38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6·25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달라진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은 대학교수들이 주도한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6·25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는 교과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
전쟁 책임의 ‘물타기’가 대표적이다. 6·25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치밀한 준비 끝에 감행한 것이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소련 측의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전모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엉뚱하게도 누가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흐리는 쪽으로 가버렸다.
교과서들이 ‘전부터 남북한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 강조한 이유는 남북한이 서로 다투던 와중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남침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작은 싸움’이 빈번하다 보니 ‘큰 전쟁’으로 번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 교과서는 ‘전쟁이 산하를 찢어 놓다’라며 몹시 비통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6·25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교과서만 보면 알기 어렵다. 민간인 피해의 경우 별도의 항목까지 만들어 남한의 책임을 묻고 있어 잘못이 오히려 남한 쪽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중공군 개입’을 ‘중국군 참전’이라고 바꾼 것은 기막힌 왜곡이다.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한반도 전체를 거의 장악해 통일을 기대하던 시점에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한국으로선 통탄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교과서가 ‘중국군 참전’이라거나 ‘중국이 군대를 보냈다’고 기술한 것은 이 문제를 정확히 가르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2000년대 사용됐던 한 교과서는 미국의 6·25 참전은 ‘개입’으로, 중국의 개입은 ‘참전’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교과서 내용으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국내 지식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내걸었던 관점 그대로다. 그는 “남북한의 내전(內戰) 상태에서 6·25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공산권 자료 공개로 그의 이론은 빛을 잃었다. 이른바 내전론은 ‘부분적 충돌’이라는 ‘나무’만 보고 ‘북한 소련 중국이 기획한 전쟁’이라는 ‘숲’은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과서는 30년 전 그가 만들어 놓은 낡은 틀에 아직도 갇혀 있다.
6·25 역사를 허물려는 시도는
교과서뿐이 아니다. ‘6·25전쟁’이란 명칭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공식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학계에선 ‘한국전쟁’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일부
학자들은 6·25라는 발발 시점을 강조한 명칭이 달갑지 않은 듯하다.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6·25의 기존 해석을 깎아내리려는 연장선 위에 있다. 일부 세력의 운동 목표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상처를 내는 일에서 6·25를 뒤흔드는
일로 옮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무리 6·25 역사를 허물려고 해도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이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부흥 세력에 흠집을 내고, 한국을 도와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이끄는 것일 터이다. 기성세대에는 6·25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다. 6·25를 잘못 가르치는 일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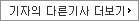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아무리 6·25 역사를 허물려고 해도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이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부흥 세력에 흠집을 내고, 한국을 도와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이끄는 것일 터이다. 기성세대에는 6·25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다. 6·25를 잘못 가르치는 일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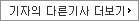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6.25 動亂史'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반도 지속 지배’ 일본의 망상 만주 이권 노린 소련의 기만 (0) | 2015.09.16 |
|---|---|
| [讀者手記] 어느 학도병의 6·25 (0) | 2015.09.16 |
| 6·25전쟁 발발 64주년…단돈 3만원에 딘 소장을 인민군에 팔아넘긴 한국인 (0) | 2015.09.16 |
| 6.25 동란 때의 터키군의 활약상 (0) | 2015.09.16 |
| BBC가 보는 6.25 동란 (0) | 201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