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애증의 현장을 찾아/1부: 갈등과 충돌]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씨
2014, 4.30, 동아일보

“한국은 가장 가까운 국가여서 적으로 삼기에 편하다. ‘한국이 일본 영토를 뺏으려 한다’고 선전하면 일본인 누구라도
흥분하게 돼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외(排外)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온 프리랜서 언론인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사진)
씨는 혐한 시위의 배경을 이렇게 짚었다. 그는 지난달 17일 동아일보 도쿄(東京) 지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일본인들이 무서워해야 할 상대는
중국과 북한이지만 유독 한국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혐한 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2007년경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시위에선 약 200명이 모였다.
야스다 씨는 “경제 침체 이후 일본 사회가 급격히
우경화됐다. 재특회에 동조하는 일본인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위축됐고 ‘우리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는 설명이다. 혐한 시위자들은 ‘내가 입은 피해는 일본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한국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며 한국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사회 불만층을 흡수한 정치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라는 게 야스다 씨의 분석이다.
인터넷 뉴스를
열심히 읽고 있다. 정보가 많으니 한국을 때릴 소재를 찾기도 쉽다”고 말했다.
야스다 씨는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한국 기사는
군위안부와 영토 문제뿐이다. 일본인들은 좀 더 한국을 잘 알아야 한다. 한일 역사와 문화를 아는 ‘성숙’ 단계를 거치면 혐한 시위도 자연히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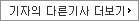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재일 한국인 울리는 차별 200개… 이젠 대놓고 “너희가 싫다”
기사입력 2014-04-30 03:00:00 기사수정 2014-04-30 09:10:15

6월 22일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49주년을 맞지만 재일 교포나 한국 출신 기업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멸시에 시달린다.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던 ‘조센진(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는 유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① 지난달
16일 재특회가 주도한 혐한 시위가 도쿄 이케부쿠로 역 근처에서 벌어졌다. 한 시위자가 ‘이상한 민족주의, 끝없는 반일운동, 세계 굴지의
반일국가, 바로 한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① 지난달
16일 재특회가 주도한 혐한 시위가 도쿄 이케부쿠로 역 근처에서 벌어졌다. 한 시위자가 ‘이상한 민족주의, 끝없는 반일운동, 세계 굴지의
반일국가, 바로 한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1977년 차별백서를 만들면서 차별 수를 확인한 적이 있다. 공영주택 입주, 금융 거래, 취업 등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이 200여 개나 됐다.
기업인들은 특히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고통스러웠다. 현금 회수가 빠른 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재일 동포들이 슬롯머신(일명 ‘빠찡꼬’) 사업에 손댄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일본이 1952년 도입한 지문 날인 제도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봤다. 당시 외국인의 대부분은 징용으로 끌려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한국인이었다.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할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했던 재일 동포들은 굴욕감과 차별감으로 치를 떨었다. 지문 날인 제도는 한인들의 끈질긴 철폐 운동 끝에 1999년 8월에야 완전히 사라졌다. 오키나와(沖繩) 출신인 작가 나카무라 기요시(仲村淸司·56) 씨는 “어릴 때 오사카에서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인 가게를 수없이 봤다”고 말했다.
영주권이 없는 한인들도 곳곳에서 차별의 벽에 부닥친다. 일본 지사로 파견 온 한국 중견기업 직원 A 씨(40)는 지금도 2년 전 은행 통장 만들 때를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의 지점은 “6개월 이상 일본에 살아야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며 통장 개설을 거절했다. 다른 지점에 갔더니 “통장은 만들 수 있지만 입금될 때마다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A 씨가 재직증명서, 월수입, 한국 통장 잔액 증명서를 다 제출한 뒤에야 은행이 통장을 만들어줬다.
 ② 3일 오사카
역 앞에서 극우 단체가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② 3일 오사카
역 앞에서 극우 단체가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다.최근 들어 공영주택 입주, 지방공무원 임용, 국가자격증 취득 등에서 한인들에 대한 예외적 차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대신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적으로 몰아세우는 혐한 시위가 일본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달 3일 오후 7시 일본 오사카(大阪) 역 앞. 일본 극우단체 회원 10여 명이 모여 ‘한국은 거짓말쟁이,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미국에서 한국 어린이가 일본 어린이를 구타하고 라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우리(일본) 아이들이 이런 멸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국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들은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위안부 상을 철거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었다. 2시간 동안 연설하는 가운데 한국을 ‘바보 국가’, ‘거짓말쟁이 국가’라며 끊임없이 비방했다.
 ③ 11일
도쿄의 대형 서점 분쿄도에 진열된 한국 폄훼 잡지와 서적.
③ 11일
도쿄의 대형 서점 분쿄도에 진열된 한국 폄훼 잡지와 서적.가장 규모가 큰 혐한 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지난해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벌인 데 이어 올해 긴자(銀座), 이케부쿠로(池袋) 등 시내 중심가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요네다 류지(米田隆司) 재특회 홍보국장은 지난달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오쿠보 데모로 한국 정부에 일본의 분노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시위 장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을 모두 강간하라”, “난징대학살이 아니라 쓰루하시(鶴橋·오사카의 한국 상가 밀집지역) 대학살을 벌이자” 같은 살벌한 구호를 외친 배경에 대해 그는 “그만큼 일본인의 분노가 컸다는 증거다. 한국은 그런 구호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험악해지는 사회 분위기
극우 단체들이 주도하는 혐한 운동에 편승해 일본 일반 시민들의 반한 감정도 악화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파견 온 한국 중견 기업의 간부는 최근 택시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운전기사가 한국인임을 눈치채자 대뜸 반말을 했다. 기본료(710엔·약 7300원)가 비싼 대신 친절하기로 소문 난 일본 택시지만 한국인을 깔보는 투가 뚜렷했다.
'日本, 韓.日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 (0) | 2015.10.03 |
|---|---|
| 중국 학계에서 보는 '일본인'과 '일본고대사' (0) | 2015.10.03 |
| 「歳月」이 아닌「世越」이라는데...日本經濟新聞 의 착각 (0) | 2015.10.03 |
| Papers prove Japan forced women into second world war brothels, says China (0) | 2015.10.03 |
| How Japan Copied American Culture and Made it Better (0) | 2015.10.03 |